[세상사]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탑은 고려시대 몽고가 침입했을 때 불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이는 대략 80m 가까이 되고, 한 변이 22.2m, 면적이 150평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짐작하기 어려운 규모다.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7년까지 복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지만,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참담한 기억이 멀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숭례문이 불탔다. 정면 5칸, 측면 2칸, 중층(重層)의 우진각지붕 다포(多包)집이다. 전면의 길이가 약 22.9m이고 측면은 약 7.8m이다. 숭례문은 1395년(태조 4)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다. 건립하는데 3년이 걸렸다.

서울시내에 있는 옛 목조건물 건물 가운데 아름답기로 치면 빠지기 어려운 게 경회루다. 경복궁 내에 있는 경회루는 정면 7칸(34.4m), 측면 5칸(28.5m)의 건물이다. 연회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니만큼, 그 규모와 건축미에서 숭례문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주변에 널찍한 연못까지 끼고 있다. 유홍준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경회루를 건축하는데 고작 8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굴삭기는커녕 삽자루 하나도 변변치 못했던 시절에도 그랬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도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 건축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1979년 정부는 지금의 장경판전과는 좀 떨어진 위치에 새로운 판고를 지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이었다. 그런데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데 하루 수백 만 원이 들었다. 그렇게 해도 경판이 상했다. 결국 대장경 경판은 옛날 장경판전으로 다시 옮겨졌다.
석굴암도 말씀이 아니다. 전면이 거대한 유리벽으로 막혀 있고, 송풍기와 제습기 등 온갖 기계장치가 동원되어 겨우 관리되고 있다. 그 기계들이 멈추면 화강암 석불에 이끼와 곰팡이가 핀다.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보수공사가 천 년을 버텨온 ‘숨 쉬는 석굴’을 망쳐 놓은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석굴암에 균열이 50여 군데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광화문 현판에 대한 기억도 있다. 어떤 글자를 쓸 것인지 한참동안 논란을 빚은 후에 겨우 걸었다. 그런데 현판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가운데에 길쭉하게 금이 갔다. 이제 현판의 재질로 금강송을 썼는지 그냥 일반 소나무를 썼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과연 수종이 문제인 것일까.
더욱 참담한 사례들이 즐비하다. 건축물은 고사하고 현판하나 제대로 못다는 게 쇠와 돌과 나무를 다루는 이 시대의 정직한 실력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황룡사 9층탑을 복원한다는 소식에 기쁘기보다는 염려스러움이 앞선다.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다. 꼭 우리가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자. 남이 해도 상관없고, 나중의 누군가가 감당해주면 고마운 일이다. 이 시대에 진정한 복원의 미학은 차라리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닐까.
[禪說]
옛날의 여러 성인들은 말없이도 전수하였으니, 이심전심이라고 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스승에게서 배워서 이심전심의 마음을 등지고 말로 전수하면서 그것을 이른바 종지(宗旨)라고 한다. 스승 노릇 하는 자가 이렇게 눈이 바로 박히지 않았으니 그 밑에서 배우는 이들 또한 올바른 뜻을 내지 못하고, 그저 속히 선(禪)을 이해하려고만 덤빈다. 심지(心地)를 열어 안락함에 이르고자 하지만 난감한 일이 아니겠는가. …… 기묘하고 신기한 온갖 말들로 된 여러 스승들의 말과 비밀스럽게 전해 받았다는 옛사람들의 공안(公案)이라고 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독(毒)이다.
《대혜어록(大慧語錄)》에 나오는 글이다. 선(禪)은 남의 입이나 책을 통해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지(心地)를 열고 키우는 일임을 경책하고 있다. 이심전심은 내 뜻을 남에게 전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각자 서로의 심지를 키워나가는 쌍방통행이다. 진정한 교육은 전달하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심지를 키워내는 일이다.

살아가는 일이 대개 그렇듯이, 책을 보거나 남의 말을 들어서 되는 건 별로 없다. 모든 결과물과 성과물은 결국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람을 도외시하고 마음을 멀리하는 세월이 깊어지고 있다. 철학이나 문학 예술을 하는 전공하는 대학의 학과들이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죄다 폐과되고 있다. 모두 다 심지(心地)를 키우는 학과들이다.
작고한 정기용 건축가는 면사무소 설계를 의뢰받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이리저리 만나고 다녔다. 사람들은, “면사무소는 뭐 하러 짓나. 목욕탕이나 지어 줘!”라고 한 결 같이 말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쩌면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는 무주 안성면 면사무소이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와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한 사람이다.
그의 별칭은 ‘말하는 건축가’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뜻이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건축가는 추상적 의미의 사회적 요청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를 공간으로 반영해야 한다. “건축의 본질은 인간에 있다”고 그는 늘 말했었다.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행정가, 경영자, 기술자가 즐비하다. 그런데도 대학에서는 사람의 심지를 키워내는 학과들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문학은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떤 태도로 먹고살아야 하는지는 묻고 배우는 것이다. 이 물음이 사라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황룡사 9층탑을 세울만한 사람이 당시 신라에는 없었다. 백제의 공장(工匠)인 아비지(阿非知)를 데려온 다음에야 겨우 세웠다. 처음 탑의 기둥을 세우던 날, 그는 백제가 멸망하는 꿈을 꿨다. 그는 한동안 손을 놓았다.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기까지, 그의 마음속에서 있어났을 일은 너무 멀어 짐작되지 않는다.
아비지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백제에는 나무와 쇠와 하늘을 읽어낼 수 있는 인문 문화적 심지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사회는 그들의 눈과 귀를 알뜰히 잃어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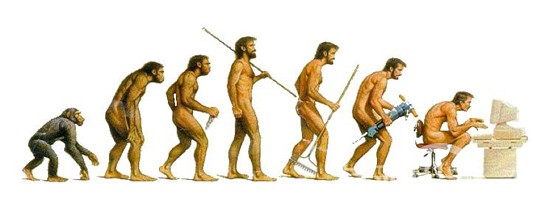
과거의 호모 파베르(Homo faber)들은 시간을 대하면서도 시간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경계했다. 모든 광물은 하늘의 궁륭에서 떨어졌거나 대지의 내장에서 적출된 신성(神聖)이었다. 그리고 노동은 물질의 변형과 완성 과정에 인간이 신을 돕는 엄숙한 의례였고, 하늘과의 신비로운 연대였다.
철과 금은 광물이 억겁의 시간을 거치며 모든 부정(不淨)에서 해방된 절대적 본질과 자유였다. 더 이상 부패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지점이었다. 죽은 왕들은 금으로 장식되거나 덩이쇠 위에 뉘어져 편안했을 것이다.
인간이 시간을 인수하면서 시간에 대한 외경과 자연·우주에 대한 경배를 잃은 것이 현대 호모 파베르들의 비극이다. 믿음은 사라지고 야망만 남았다. 아즈텍의 추장들에게 그들의 칼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묻자, 그들은 하늘을 가리켰다. 그 하늘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