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사 경내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은 말그대로 일망무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 있을까?
절정에 오른 태양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삼각산[북한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보현보살이 앉아 계신 봉우리[보현봉]을 향한 발걸음은 가벼웠다. 산길이라곤 하지만, 나무나 돌로 만든 계단이 정연하게 놓인 까닭이다.
산책로 같은 길을 따라 햇살에 반짝이는 낙엽,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청솔모 등은 ‘삿된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기도처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들게 했다. 한 시간 남짓 쉬엄쉬엄 보현봉을 향해 올라가다 샛길과 마주쳤다. 그곳에는 일선사(一禪寺)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일선사는 삼각산 보현봉 바로 아래, 등산로와 인접한 곳에 앉아 있는 절이다. 그래서 불자 등산객들이 한숨 쉬어가고자 빈번하게 들리는 곳이다. 그들은 일선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포대화상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 한 바가지를 마시고, 경내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망’을 즐긴다.
그리고 그들은 “선경과 다를 바 없다”며 “심신(心身)에 붙어 있는 티끌이 날아갈 듯 시원하다”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일까. “비구니 스님 도량인 일선사가 수행․기도처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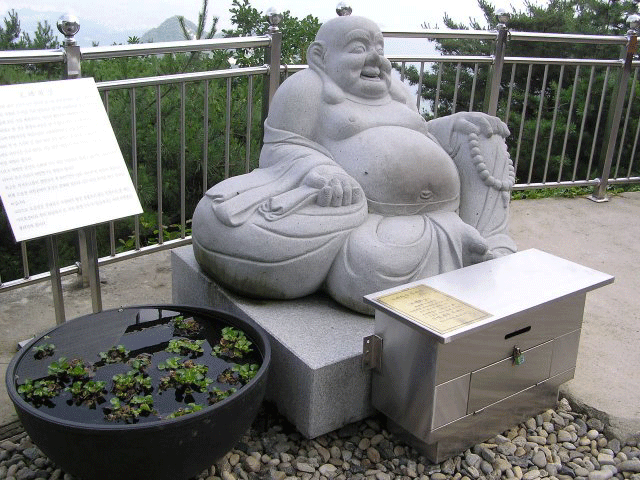
천진스런 웃음으로 불자를 제접하는 포대화상.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 맛은 일품이다.
일선사는 90년대 말경 지금의 모습으로 중창한 사찰이지만, 사실 그 역사의 시작에는 도선국사의 손길이 닿았던 ‘천년고찰’이다. 그래서 지금도 삼각산 제일의 수행․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선사 경내 초입에 세워진 안내판에 따르면, 이곳의 본래 사명(寺名)은 ‘보현사(普賢寺)’로, 신라 말 도선(道詵․827~898) 국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창건 당시 절(보현사)은 일선사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고려시대 탄연(坦然․1070~1159) 국사와 조선시대 무학(無學․1327~1405) 대사가 각각 중창했다고 한다.
또한 안내판에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소됐지만, 1600년대 한양 수비 요충지로 주목받아 복원돼, 함허(涵虛․1376~1431) 대사 등의 고승들이 주석했다고 게재되어 있었다.
그 뒤 김만신행이라는 불자가 1940년 지금의 일선사 위치로 절을 옮긴 후 절 이름을 관음사(觀音寺)로 번경했으며, 불교정화 당시 고은(법명 일초) 선생이 이곳에서 공부하며 도선(道詵)의 ‘선’자와 일초(一超)의 ‘일’자를 따, 다시 절 이름을 일선사(一禪寺)로 바꿨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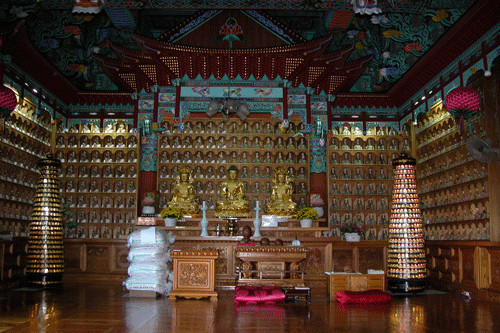

삼각산 보현봉과 일선사 대웅전. 대웅전에 봉안된 부처님과 협시보살은 불상조각장 이진형(대전시 무형문화재)의 작품이다.
지금의 사격은 정덕 스님(현재 해인사 자비원 주석)에 의해 1988년부터 10여년간 새롭게 중창한 모습이다. 이때 대웅전, 약사전, 요사 등이 들어섰는데, 전각 대부분 인간문화재 전흥수 대목장의 작품으로 주변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사찰의 멋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산신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1986년 이교도들의 방화에 의해 전소됐다. 훼불 행위는 산신각에만 머물지 않았다. 절에서 30여미터 떨어진 보현굴(일명 다라니굴) 주변 바위에 새겨진 칠성도와 산신도 역시 방화로 크게 훼손됐다고 한다.
존재란 무릇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처럼 작은 도량에 한때 고승 대덕이 주석하고, 한때 조선의 도읍을 지켜내고, 한때 비구니 스님이 원력을 펼치고 한때 이교도의 시샘을 받으며 얽힌 이야기의 무게가 육중하다.
지금의 일선사에는 가야산문[해인사]의 가풍을 배운 4명의 스님들이 매월 초하루 불자들과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信心)을 다잡고, 휴일마다 등산객들에게 점심 공양을 제공하며 전법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다.
▲일선사 |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 6-1번지 | (02)379-8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