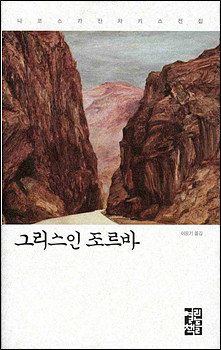
앞서 필자는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에 대해 논하면서 주제와 구성이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등장하는 선재동자의 구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와 인물은 선종사(禪宗史)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는 임제 의현(臨濟 義玄) 선사의 행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까닭에 조금 비약해서 비교하면 《싯다르타》는 교(敎)에, 《그리스인 조르바》는 선(禪)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구성주의 비평으로 볼 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는 인물(캐릭터)의 형상화가 성공적일 때 얼마나 그 작품이 빛을 발하는지를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명작이다. 인물의 형상화가 잘된 작품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리스인 조르바》 역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 있다.
그런데 《그리스인 조르바》는 불교적인 제재를 다루거나 불교사상을 전면 내세운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출·재가자 문인인 법정 스님과 한승원 작가가 이 작품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소설로 손꼽고 있다.
기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주인공인 ‘나’가 붓다에 대한 작품을 쓰고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표면적으로는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왜 많은 이가 이 작품을 불교문학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조르바라는 인물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은 소감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조르바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 좀 들읍시다. 요 몇 해 동안 당신은 청춘을 불사르며 마법의 주문이 잔뜩 쓰인 책을 읽었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종이도 한 50톤쯤 씹어 삼켰을 테지요. 그래서 얻어낸 게 도대체 무엇이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준엄한 질문처럼 들렸다.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많은 종이를 씹어 삼키면서 얻어낸 게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본질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이벌레에 그치고 만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가 살았던 크레타에 한 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1995년 여름 볼일로 파리로 갔다가 그리스로 날아갔다.
(중략)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성루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가 있었다.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쓰인 글은 작가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같다. 작품 속에서 조르바는 아무것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작품 속에서 화자가 조르바를 처음 만났을 때 둘은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지!”
조르바는 질그릇을 만들려고 물레를 돌리는 데 거슬린다는 이유로 도끼로 새끼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그 어디에도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을 지녔다. 작품 속 화자가 본 대로 조르바는 “살아 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인 것이다.
그래서 조르바는 인간의 이성이란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궁둥짝” 정도로 여긴다. 조르바가 화자에게 “당신의 그 많은 책 쌓아 놓고 불이나 싸질러 버리시구려. 그러면 알아요? 혹 인간이 될지?”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 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그런 이성적인 삶이 아닌 탄광 일을 할 때는 갈탄과, 산투르를 연주할 때는 산투르와 혼연일체가 되는 직관의 삶을 사는 조르바이기에 슬플 때거나 기쁠 때거나 감정이 북받치면 아무 데서고 춤을 추는 기벽(奇癖)이 있다. 조르바는 하느님은 자비로운 존재라고 믿지만 “여자가 잠자리로 꾀는데도 거절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절당한 여자는 풍차라도 돌릴 듯이 한숨을 쉴 테고, 그 한숨 소리가 하느님 귀에 들어가면, 그자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았대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자가 도 닦는 데 방해가 된다고 성기를 자른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하자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 열쇠야. 열쇠.”라고 대꾸하는 조르바의 거침없고 파격적인 태도에서 독자들은 자신을 옥죄는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영혼에 깊은 골을 남긴 사람으로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조르바를 꼽는다. 그러니까 조르바는 카잔차키스가 직접 만난 실존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카잔차키스가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화두로 여긴 육체와 영혼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은 조르바라는 자유인을 만나 하나가 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첫 스승인 호메로스는 그의 고향인 크레타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이 크레타라는 지역은 터키로부터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역사의 장이기도 하다. 크레타 지역의 역사인 ‘압제와 자유’라는 양극 개념은 베르그송에 경도되면서 ‘신의 압제와 인간의 자유’로 이어지게 되고, 니체에 경도되면서는 ‘인간의 한계와 초인의 극복’으로 승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조르바라는 진정한 자유인과의 만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탄광 일을 할 때는 갈탄이 되고 산투르를 연주할 때는 산투르가 되는, 그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은 채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조르바의 모습은 중국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즉,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이다.’라는 가르침을 연상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많은 선사들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역설했는지도 모르겠다.
중국 당나라 때 서암 사언 스님은 반석 위에 앉아서 정진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인공아!”
“예!”
“성성하게 깨어 있어라. 성성하게 깨어 있느냐?”
“예! 깨어 있습니다.”
서암 사언의 일화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주인공임을 일깨워준다.
우리나라의 경봉 스님은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사바 사계를 무대로 한바탕 멋지게 살아라.”라고 말하였다.
경봉 스님의 말씀 역시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불교의 교조인 붓다 또한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이니 말장수가 말을 다루듯 자신을 잘 다루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인 부처님의 일화를 소개해 보자.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을 마치고 부처님은 우루벨라를 향해 교화의 길을 떠났다. 숲 속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는 부처님 앞으로 젊은이들이 몰려왔다. 그들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혹시 도망가는 여인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 여자를 어째서 찾으려고 하는가?”
“그 여자가 우리의 귀중품들을 모두 훔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달아난 여자를 찾는 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과 어떤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인가?”
“물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죠.”
부처님은 젊은이들을 자신의 앞에 앉힌 뒤 괴로움이 어디서 오며(四聖諦),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八正道) 설하였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나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것 같은 해방감을 만끽하게 되는데, 이는 임제 의현 선사의 가르침인 무위진인(無位眞人)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실, 《그리스인 조르바》의 문학적 성취는 애오라지 조르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작품의 서사는 다분히 사변적(思辨的)인 주인공이 우연히 조르바를 만나 탄광사업을 하게 되지만 결국 망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거나 추리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작품은 놀라울 정도의 가독성을 지니는데, 이는 조르바라는 야성적인 인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문학에서 캐릭터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해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서사문학에서만 인물(혹은 인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선종사(禪宗史)에서 임제 선사가 남긴 최고의 업적은 바로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하는 형이상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삶의 주체인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는 데 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와서 임제 스님에게 물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임제 스님이 “할(喝)”을 했다. 그러자 법을 청한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제 스님이 말하기를 이 스님과는 법을 말할 만하다 하였다.
임제 스님에게 할은 법거량의 상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조르바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한바탕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무위진인(無位眞人)은 임제 스님 가르침의 핵심 골수이다. 《임제록(臨濟錄)》 <시중(示衆)>에는 대중에게 훈시한 법문들이 수록돼 있는데, 무위진인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아래와 같은 구절들이다.
“붉은 살덩이로 된 몸뚱이에 지위가 없는 참사람이 하나 있다.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에 드나들고 있다.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시오.”
“그대들이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다.”
“사대(四大)는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알지 못한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눈앞에 모양이 없는 밝고 신령스러운 것이 능히 법을 설할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임제 스님은 《임제록》에서 ‘무위진인’이 되는 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행자여, 참다운 견해를 얻고자 하거든 오직 한 가지 세상의 속임수에 걸리는 미혹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모든 대상을 바로 죽여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나한(羅漢)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하여, 어떠한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투탈자재(透脫自在)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임제 스님은 “부처를 최고의 목표로 삼지 마라. 내가 보기에 부처는 한낱 똥 단지와 같고 보살과 아라한은 죄인의 목에 거는 형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두가 사람을 구속하는 물건이다.”라고 말하였다. 대자유인인 까닭에 임제 스님은 자신을 옥죄는 모든 것에서 단호히 벗어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불제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를 믿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최고 압권은 주인공이 조르바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다. 케이블과 철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다. 그리고 그때는 조르바의 애인인 부불리나가 죽은 직후이다. 그런데도 둘은 해방감에 젖어서 춤을 춰대는 것이다. 서툴지만 신명 나게 흔들어대는 화자에게 조르바는 이렇게 말한다.
“종이와 잉크는 지옥으로나 보내 버려! 상품, 이익 좋아하시네. 광산, 인부, 수도원 좋아하시네. 이것 봐요. 당신이 춤을 배우고 내 말을 배우면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소!”
조르바와의 교감을 통해서 화자가 ‘무위진인(無位眞人)’이 되는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