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말은 본래 아무 것도 담고 있지 않다. 말을 밝히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순진한 사람이거나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의미는 밝혀지는 게 아니다. 의미는 만들어질 뿐이다. 똑같은 녹취된 말을 두고 서로 전혀 반대되게 이해하는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혹자는 국어교육의 실패라고 하지만, 그건 그저 푸념이거나 비아냥거릴 뿐이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의 정체는 힘이다. 좀 정치적인 색깔을 가미해서 말하면 권력이다. 힘이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말은 권력 앞에서 너부러지고 만다. 권력이 공공(公共)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폭력성을 은폐하면 공권력이 된다. 정치권력뿐만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힘은 모두 공권력이다. 반상회나 계모임의 결정사항조차도 공권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공권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공권력이 사악한 이유는 폭력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명령한 사람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중간에서 명령을 받은 이는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발뺌한다. 맨 마지막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이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그런다. 결국 폭력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말에서 힘을 걷어내는 학문적 작업이 논리학이다. 그런데 논리조차도 권력 앞에서는 무참할 정도로 허약해진다. 오죽하면 ‘힘의 논리’라는 말이 있을까. 하지만 힘은 논리가 아니다. 힘은 그냥 힘일 뿐이다. ‘힘의 논리’라는 말은 힘의 사특한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사특함이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생각하게 된다. 저항과 탈출이다. 저항의 길이 혁명이고, 탈출의 길이 종교이다.

종교는 역사에 대한 실망이며 세상에 대한 총체적 절망에서 비롯된다. 토벌되지 않는 역사의 이물(異物)스러움에 팽팽하게 맞서 엉버티지 못한 그것은, 번번이 안으로 문을 닫아걸었다. 그러한 태도가 회의주의이며 패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욕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조차도 역사는 끝내 무의미하리라는 절망감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그 완강한 폐쇄성은 발설된 것들의 허구와 파렴치로부터 저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사생결단의 몸부림이다.
선설禪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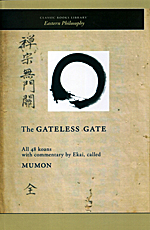
승려의 질문내용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제목으로 쓰이기도 했다. 감독, 제작, 각본, 촬영, 편집, 미술, 조명 등을 모두 배용균이라는 한 사람이 맡아 이루어낸 걸작이다. 선불교를 소재로 한 최고의 영화라고 칭송할만하다. 정전백수에 대한 허접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좀 긴 분량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어쨌든 한 승려와 조주선사 사이에 오간 문답내용을 두고도 말 겨루기가 간단치 않다. 백(栢)이라는 한자어가 사실은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라는 얘기가 있다. 조주선사가 거주했던 곳에 직접 가보니, 잣나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측백나무 천지더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천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을 두고 지금과 견주어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되받아친다.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백(栢)이라는 한자어는 잣나무와 측백나무 모두 뜻이 된다. 식물도감에 찾아보면, 측백나무는 겉씨식물 구과식물아강 구과목 측백나무과의 상록교목이라고 나온다. 잣나무는 겉씨식물 구과식물아강 구과목 소나무과의 상록교목이라고 나온다. 과(科)가 다른 수종인 것은 분명하다. 문화재 전문가의 글을 빌리면, 잣나무는 중국본토에는 아예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두만강의 북쪽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동북부 아세아에서만 잣나무가 자란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바늘잎을 가진 종류는 ‘송(松)’으로 표기하고, 비늘잎을 가진 종류는 거의 ‘백(柏)’을 붙였다고 한다.
어쨌거나 정전백수라는 문답을 두고 《무문관》을 편찬한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는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시를 적었다.
말로써는 일을 밝힐 수 없고 言無展事,
말로써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딱 들어맞게 설명할 수 없다 語不投機.
말을 따르는 자는 죽게 되고 承言者喪,
구절에 얽매이는 자는 홀리게 되리라 滯句者迷.
간단히 말하면 이 문답은 말에 걸리면 모두 끝장이라는 뜻이다. 조주선사가 말한 ‘잣나무’는 덫이다. 잣나무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 다는 것이다. 또 있다. 조사가 무슨 심오한 뜻을 전해주기 위해 서쪽에서 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죄다 말에 걸리는 사례들이다.
조주선사가 승려의 질문에 차근차근 말해주었다면 그는 질문의 덫에 걸린 게 된다. 만약 그랬다면 조주는 조주가 아닐 것이다. 그는 뜰 앞의 잣나무라는 대답 아닌 대답으로 질문의 허를 찔렀다. 뜰 앞의 잣나무는 질문자에게 자신이 던진 질문이 과연 올바른 질문인지 돌이켜 보도록 한다. 그렇게 돌이켜보아, 질문이 잘못된 지점을 찾는 순간이 바로 깨침이다.
이런 종류의 말을 선(禪)에서는 무미지담(無味之談) 즉 아무 맛도 없는 말이라고 한다. 무미지담은 의미가 없거나 의미를 거부하는 말이다. 의미와 상봉하지 못한 말은 번번이 좌초하는 방식으로 제 몸을 장사(葬事)지내면서, 말에 구속되고 규정된 의미조차 끌어안고 투신하여 공멸함으로써, 말과 의미가 구축한 모든 체계를 깡그리 무너뜨린다.
선(禪)은 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선은 말이 아니라 말에 담긴 힘을 무너뜨리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말을 하거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말의 이면에 있는 힘의 정체, 그 폭력성을 돌이켜 보라고 요구한다. 말의 이면에 있는 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 역시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은 사악하면서도 늘 가엾다.
말 때문에 말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말을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사람이 태반이다. 하지만 모든 말들이 스스로 자족하여 편안해질 때까지 말을 두고 말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말 할 수 있는 자들의 업(業)이다. 말이 힘에 휘둘리는 세상이지만, 끝내는, 말이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은 말 속에서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박재현/철학박사,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