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대한 침묵속으로
그리스 테살리아의 벌판에는 하늘의 기둥이라고 하는 바위기둥들이 솟아 있고, 그 꼭대기에 수도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메테오라(Meteora)라고 부릅니다. 메테오라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깎아지른 바위기둥 꼭대기에 위태롭게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암벽을 부여잡고 올라가 은둔생활을 시작한 게 11세기부터이고, 14세기 초에는 이런 수도사들을 위한 수도원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16세기에 이르게 되면 24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녀원 1곳을 포함하여 6개의 수도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위를 뚫어 계단을 만들었기에 오르내리기가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하지 않고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오르내릴 수 없었다는데……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 광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옛날 이 위태로운 암벽에 붙어서 죽음을 무릅쓰며 한 발 한 발 오르던 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첫째가 뜨거운 신앙심이지요.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이 고래로부터 높은 곳에 신전을 짓게 만든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높은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벌판 위 바위기둥 위에 꼭 위태롭게 자리잡고 있어야할까요? 그건 세속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세 수도원은 세속으로부터의 단절, 일체의 세속적 가치와의 격리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다큐멘타리 영화 《위대한 침묵》은 시종일관 수도원의 이런 단절과 격리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랑드 샤르트뢰즈(Le Grande Chartreuse) 수도원 자체가 알프스산맥 1300고지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그나마 수도원 둘레는 높은 담벼락으로 쳐져 있어 아예 속인의 접근을 불허합니다. 여기에 수도사들은 침묵을 서약하고 들어가지요. 고요한 침묵 속에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가 새고 지는 곳이 그랑드 샤르트뢰즈 수도원입니다.
2.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중세 수도원이 세속과의 철저한 단절을 목적으로 한 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가 유대민족의 민족종교에서 세계종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보편종교로서 갖춰야할 교리를 체계화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도입하지요.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톤 |
| 아우구스티누스 |
| 이데아계 = 영원 불변 참 이성 | ⇒ | 완전 선 창조주 = 신의 세계 |
| 현상계 = 순간 변화 거짓 감성 | ⇒ | 불완전 악 피조물 = 인간의 세계 |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불변인 참된 이데아계를 완전한 선(善)인 신(神)의 세계에, 그리고 매 순간 변화하는 거짓된 현상계를 불완전하며 악(惡)에 물들어 있는 인간(人間)의 세계와 등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세계로부터 신의 세계로의 구원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죄악으로부터의 ‘구원’과 구원의 주체인 ‘신’, 그리고 신의 ‘은총’이라는 서구 기독교의 주요 개념들이 틀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교리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도 부족해서 원죄까지 끌어들이며, 이 세계를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의 삶이란 오직 이 악의 소굴로부터 절대선인 하느님의 품으로 구원받는 일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맙니다.
“이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오니,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피조물로서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결코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삶은 오직 하느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죽어서 하느님의 품안에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랑드 샤르트뢰즈 수도원의 노수사는 말합니다.
“아니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죽음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거늘. 또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마련이거늘.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더구나 그 죽음이 하느님을 위한 순교라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런 생사관이 기독교로 하여금 어느 종교보다도 월등히 많은 순교자를 배출해 내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토록 죽음을 열망하게 만든 배후에는 현세적 삶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단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고 이 세계는 저 세계에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에 불과합니다.
3. 색즉시공 공즉시색
동서고금의 종교들은 다만 정도차이일 뿐, 대개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삶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세속의 삶이 영위되는 이 세계를 부정하면서,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다른 세계를 꿈꿉니다.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의 소산이든, 치밀한 논리적 사색의 결과이든 ‘부정적인 이 세계로부터 긍정적인 저 세계로의 초월’이라는 구도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재 첫 번째 글에서 사성제(四聖諦)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본불교는 사성제의 고성제(苦聖諦)로부터 출발합니다. 생로병사가 진행되는 이 현실은 고통이라는 인식에서 불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런 이 세계로부터 고통이 소멸한 바람직한 저 세계로의 초월, 즉 해탈(解脫)이 불교교설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 교설이 대승불교에 이르게 되면 바라밀(波羅蜜)로 구체화됩니다.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波羅蜜多)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pāramitā)의 음역으로, ‘도피안(到彼岸)’으로 번역됩니다. 고통스레 생멸유전(生滅流轉)하는 이쪽 언덕[차안(此岸)]에서 모든 고통이 소멸한 저쪽 언덕[피안(彼岸)]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지요.
| 이 세계 | → | 저 세계 |
이런 구도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세계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적 삶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고 거부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보살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꾸어 가는 이 모든 삶도 부정되어야 하는 집착이고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이런 세계관에서 이 세계를 떠날 수 없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들의 일상마저 부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처지,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계는 비참한 인생들이 태어나 아등바등 살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정말로 그토록 비참하고 그토록 더러운 죄악으로 점철된 곳인가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데……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토록 나쁜 걸까요?
대부분의 세계종교와 보편철학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현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 위에 인류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기독교와 그리스 이성주의 철학 위에 서구문명이 세워지고, 유교의 도덕적 이상주의 위에 중국문명이 피어났습니다. 불멸(佛滅) 이후의 불교 또한 본격적으로 불교문명을 발전시키며 이런 이원적 우주관을 띠게 됩니다. 초기 상좌부 불교가 대개 이런 논리를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세계가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울수록, 저 세계는 더 황홀하고 더 행복해집니다. 또한 그럴수록 저 세계에 도달코자 하는 열망은 더 강렬해지고, 열망이 강렬할수록 저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은 더욱 강해지겠지요. 역사는 이런 진행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가 그렇게 확연히 구분된다면 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재능이 탁월하거나,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절대자의 선택을 받았거나 등등… 결국 다수의 대중들은 저 세계에 가 보지도 못한 채 험한 이 세계를 맴돌며 고통 속에 살다 가겠지요.
대승은 이 세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 모두를 저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철학입니다. 이를 위해 대승불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방법과 논리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저 세계라면 이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계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단 한 생명이라도 가지 못하는 자가 나오게 되겠지요.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생명조차도 빠뜨리지 않고 저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세계가 그대로 저 세계가 되는 길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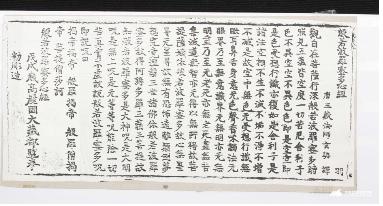
바로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이지요. 색(色)은 생멸하는 이 현상세계이고 공(空)은 열반적정한 진리의 저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색이 곧 공이다’라는 선언은 이 세계가 바로 저 세계라는 주장입니다. 이로써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길을 찾는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고통스레 현실을 살아가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을 구해내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색즉시공”, 이 한 구절이야말로 소수에게 독점된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돌려주려는 혁명선언이고, 모든 중생을 일체의 질곡으로부터 풀어주려는 해방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고통 받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그들 모두를 해탈로 이끌겠다는 열망이 이 세계 그대로를 큰 수레[大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문갑/철학박사,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