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 도덕 근원으로서의 신(神)
테베에 닥친 재앙은 오이디푸스의 부도덕이 원인으로 밝혀집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패륜이지요. 이 패륜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중의 신인 제우스는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쫓아내고 누이인 헤라와 결혼합니다.
오이디푸스와 제우스의 차이는 살인과 추방, 어머니와 누이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어찌보면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 같은데…… 누구는 천하의 패륜아가 되고, 누구는 모든 존경을 받는 최고의 신이 됩니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 의하면 친부살해는 세대교체를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입니다. 근친혼은 인류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이디푸스의 행위가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와야할 만큼 부도덕한 것일까요? 이참에 물어봅니다. 도덕과 부도덕의 경계는 어디냐고?
도덕은 어떤 행위는 해도 좋고, 어떤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경계를 표시합니다. 누이와의 근친혼은 해도 되지만,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친혼과 근친상간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경계선 이쪽인지 아니면 저쪽인지를 말해줍니다. 다시 물어 보지요. 도대체 이 선은 누가 그은 건가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이 그리고 있는 도덕의 근원은 신입니다. 신에 의해 내려진 재앙은 곧 오이디푸스의 행위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신에게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지요. 이 시대의 도덕은 신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신이 지금 질병을 나에게 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질병을 추구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신들은 헬레니즘 시대에 오게 되면 로고스(logos), 즉 형이상학적 이법(理法)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신의 섭리(攝理)는 그대로 자연의 법칙이 되는 것이지요.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은 이런 자연의 이법에 따른 삶이 곧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세계의 도덕률은 신, 혹은 형이상학적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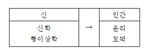
절대적 권능을 지닌 유일신이거나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보편법칙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도덕적 당위는 지상의 명령이 됩니다. 이렇게 초월자나 보편자의 시선으로 도덕률을 규정하는 사유전통에서 <신학적 윤리학>이 나오고, <형이상학적 도덕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 내 위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내 안에는 도덕률
신학적 도덕학의 논리구조를 뒤집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칸트입니다.
“세계 안에서나 세계 밖 아무 곳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善意志)뿐이다.”
선의지는 그것이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준수코자 하는 의지입니다. 칸트에 의한다면 오직 선의지만이 순수하게 선한 것입니다. 칸트 이전에 완전히 선한 존재는 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칸트에 오게 되면 도덕법칙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선의지만이 완전히 선한 것입니다. 이제 도덕적 선의 근원은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래 놓고 칸트는 신의 존재를 요청합니다.
신은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무조건 존재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이 있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칸트에 이르러 신은 그 자리를 인간에게 내어주고 부가적인 조건으로 내려옵니다.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은 인간이 도덕판단의 근원이며 실로 이 세계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락사 시킴으로써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남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칸트철학에서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도덕법칙은 현실의 고통에 대해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체계에서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힘은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신의 존재를 요청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3. 신은 죽었다
〈원 나잇 스탠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맥스(웨슬리 스나입스 분)가 뉴욕에 출장차 왔다가 우연히 카렌(나스타샤 킨스키 분)이란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형의 부인이었지요. 그리고 맥스의 아내는 바로 그 친구의 형과 불륜관계를 맺고, 결국 두 커플은 서로 부인―남편―을 교환하게 됩니다. 하룻밤의 우연한 불륜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경우의 불륜은 좋은 것 아닌가요? 하느님은 비록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이지요. 니체는 말합니다.
“기독교에 오면 모든 것은 벌이 되어버린다.…기독교인은 불행할 때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내팽개쳐진 자라고 느끼는 것이다.”
신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군림하는 난폭한 폭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은 허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도덕이나 종교 그 어느 것도 현실과 단 한 지점에서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신이 정말로 죽고 없다면, 오이디푸스도, 맥스와 그의 이웃들도,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는 허용되는 걸까요?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꿈꾸었던 세계는 아니었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계를 위해 정말로 신을 죽여야만 한다고 니체는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 연기(緣起)이므로 공(空)이니라
서양철학사를 보면 인간들은 처음에는 신에 의지해 살다가 나중에는 신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신을 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손바닥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사유 속에서 신은 단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우쫑싼[牟宗三]선생은 이런 서양철학을 ‘존재를 위한 투쟁(Struggle for Being)’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유의 방향 자체가 존재를 향하거나 잠시라도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의 철학적 특징은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투쟁(Struggle for Non-Being)’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무아(無我)를 말하면서 이 현실세계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었고, 그 대답으로 현상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유의 방향으로 볼 때, 이는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유를 하게 만듭니다.
“누가 접촉(觸)합니까?” 부처님은 파구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접촉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접촉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너는 마땅히 ‘누가 접촉합니까?’라고 물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응당 ‘무엇에 인연해서 접촉이 생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육입처에 연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에 연하여 느낌(受)이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기 파구나의 질문은 어떤 존재를 전제하고 묻는 것입니다. 파구나의 의식 속에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에 의해 이 세계가 연기한다는 관념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는 끊임없이 존재를 찾고 존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존재를 위한 투쟁’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존재를 추구하는 사유야말로 상견(常見)이고 증익견(增益見)입니다. 상견이란 변치않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고, 증익견이란 이 세계에 다른 존재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상을 더하는 것입니다. 종교사상를 포함하여 서양철학은 시종일관 상견을 견지합니다.
‘신’, ‘이데아’, ‘형상’, ‘실체’ 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은 불교교설에서 볼 때 모두 상견이고 증익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수천 년 세월동안 서구인들은 환상을 좇아 스스로를 구속하고 벌 주었던 것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환상을 제거함으로써 이 세계를 긍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 또한 존재지향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환상이 떠난 그 허무(虛無)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결국 니체는 초인이라는 또 다른 환상을 창조함으로써 허무의 자리를 메꾸려 한 것은 아닐런지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니체는 신을 제거하는 단견(斷見)이자 감손견(減損見)으로 출발하여 다시 초인(超人)을 부르면서 상견과 증익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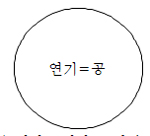
신이 그랬고 이데아가 그랬습니다. 신탁이 가르쳐준 운명 앞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뽑아야 했고, 이오카스테는 자결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에서는 이들보다 몇백 배 더 부도덕한 앙굴리마라도 용서가 됩니다. 이런 한없는 용서는 해악을 벌할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인연이 살인마를 만든 만큼, 좋은 인연이 맺어지면 훌륭한 성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아(無我)이므로 연기로 존재한다.”는 해석은 현상계를 해명하기 위한 변명이며 논리적 사유일 뿐입니다. 이는 진정한 불교교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연기(緣起)이므로 공(空)이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로부터 공을 말하는 이 사유의 방향은 일체의 환상을 깨부수고 모든 독단을 제거하려는 ‘존재부정을 위한 투쟁’이자, 환상을 좇아 온갖 고통과 비극을 만들어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한없는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김문갑 / 철학박사, 충남대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