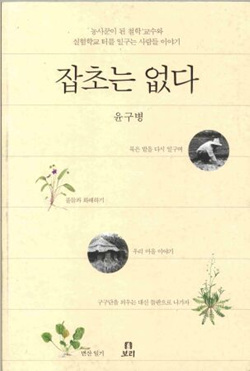
원래 자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쓰레기'라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나무 등걸은 뗏목으로 쓰면 되고, 혹 못 먹고 남은 음식이 있더라도 모두 자연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아님 가축이 먹어주겠지) 쓰레기가 없었는데. 지금 현대에는 세상에 넘쳐나는 게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 불필요한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쓰레기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건 모두 ‘기르는 문화’가 ‘만드는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윤구병 지음 / 보리 펴냄
나이 쉰 고개를 넘어서 15년 동안 재직했던 철학교수직을 버리고 전북 변산 운산리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불자교수 윤구병 씨.『잡초는 없다』(보리 刊)는 그가 변산에 내려간 뒤 ‘실험학교’와 ‘변산공동체’를 일구면서 겪고 느낀 일들을 잔잔하게 쓴 것이다. 아무도 버림받지 않은 삶터를 일구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수필이라 가볍게 읽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위안을 준다.
1장에는 주로 교육과 관련한 글, 2장에는 실험학교 터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 3장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생각을 묶었다. 4장은 변산에 내려온 뒤 계속 써 온 ‘변산일기’를 소개했으며, 5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힌 ‘생명을 살리는 농업’ 등 2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럼 그에게 ‘잡초’란 무엇이었을까. 사실 그가 처음 대한 ‘잡초’란 돈 되는 작물의 양분을 빼앗아 먹는 한갓 풀떼기였다. 사실 우리는 ‘잡초’와 ‘잡초가 아닌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려는 습성이 있고, 그 판단 근거로 효율과 이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는 순간까지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윤 씨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잡초란 없다’며, 우리의 의식구조 자체에 반문을 던진다. 아마도 윤 씨는 ‘잡초는 없다’는 의식은 잡초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 잡초와 잡초가 아닌 것을 나누지 않는, 근원적으로는 잡초라는 것을 모르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이렇듯 생활 속의 지혜와 서로 도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학교보다는 일터가 더 좋은 배움터임을 일깨운다. 남들이 선망하는 세속의 명예와 부를 버리고 공동체 삶을 사는 윤구병 씨는 외친다. “구구단 외는 대신 들판으로 나가자.”
편집실/
